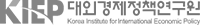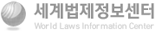전문가오피니언
라틴아메리카의 ‘연대’를 생각하며
중남미 일반 안태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 2013/03/28
아르헨티나의 메넴정권 시절인 90년대, 메넴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총자본에 비해 총노동을 약화시키고 구조조정의 결과로 노동자 대중의 대량 실직이 생기면서 개인적 파편화와 절망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90년대 중반까지 노동자들은 제대로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앞서 80년대 말,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고통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인 “페소화 태환조치”(dolarizacion)를 통한 즉각적인 물가안정정책을 대중이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90년대 후반부터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아르헨티나의 실직자들은 연대하여 “피케테로스 운동”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어느 정도 극복하려는 새로운 정치체제인 키치네르 체제를 만들어 낸다. 피케테로스 운동은 단순히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얻어내기 위한 시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네주민들과의 연대 그리고 중산층과의 강한 연대를 이루어낸다. 그렇다면 그 연대의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다음과 같다. 라틴아메리카의 가난한 대중이 동네에서부터 이웃들과 평소에 가깝고 정다운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또한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라틴아메리카 사회는 중간계급이 가난한 대중을 그렇게까지 무시하고 배제하지는 않는다.
재일 동포 학자로 도쿄대 교수인 강상중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살률이 높은 것을 가슴아파하면서 설득력 있는 다양한 대안을 프레시앙 칼럼에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획일적인 ‘행복’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우리와 일본의 일직선적 줄서기 방식의 획일적인 ‘행복’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는 맞는 말이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오랜 시기 동안 집단적 성향으로서 무의식적으로 굳어진 삶의 방식 또는 문화는 부르디외가 말하는 ‘아비투스’이므로 그것을 단기간에 깨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우 긴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 같은 문제제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강상중의 글 중에서 필자가 크게 공감하는 부분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당시 가난한 대중이 물물교환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지적이다. 물물교환은 우리가 아는 근대경제, 화폐경제의 프레임과는 매우 다른 고대의 경제 사회적 방식이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만이 아니라 페루, 칠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물물교환을 통한 위기 극복의 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매우 흔하다. 예를 들어 80년대 경제위기 당시에도 페루와 칠레 등에서는 가난한 여성들이 주체로서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국그릇 공동체’ 또는 ‘우유 잔 공동체’를 만들어 가난한 이웃을 돕고 연대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필자가 2012년 초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갔을 때 직접 들은 이야기 중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렇다. 2001년 경제위기 당시 실업률이 치솟고 생계가 힘든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이발사는 이발 기술을 교사는 아이들에 대한 학습 지도의 서비스를 이웃의 빵과 교환했다고 한다. 어떻게 들으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사실이다. 이런 연대의 맥락에서 엄청난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자살자가 없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아르헨티나의 2000년-2001년 경제위기 극복은 바로 이런 방식의, 마치 굼벵이가 기어가는 것 같은 ‘연대’로써 위기를 극복한 것이지 좌파 정당의 리드에 의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진보 정당의 엘리트 지도부가 대중에게 교육시키고 가르침을 주는 방식의 계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조직 노조의 단결과 투쟁에 의해서도 아니었다. 투쟁의 불길을 이끈 동력은 미약하고 흩어져있던 평범한 ‘실업자’들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약자인 실업자들이 스스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고 투쟁 전에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계급투쟁’시각의 접근이 아니라 라클라우가 이야기한 새로운 ‘포퓰리즘’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글은 논문이 아니므로 자세한 언급을 할 수 없지만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이미 형성된 일정한 사회의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담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변혁적 정부들이 집권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의 정치 변혁의 성공은 바로 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평범한 ‘대중의 요구’에 부응한 라클라우 시각의 포퓰리즘적 “정치적인 것”의 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중의 요구’의 흐름을 우리사회에 대입한다면 어떨까? 아르헨티나의 경우 30-40년대에 도시에 거주하면서 개혁적 자유주의적 지향을 가진 엘리트 지식인들에 의해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던 일반 대중인 “셔츠 없는 사람들”이 페론체제를 낳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 맥락과 비슷하게 70-80년대를 거치면서 돈벌이를 위해 시골에서 상경하여 서울에 살고 있지만 구정(설)이면 대거 시골로 돌아가는 평범한 대중 특히 과거의 전통적 지연과 혈연적 ‘연대’의 공동체 문화에 대해 향수를 가지고 있는 50대와 60대의 평범한 대중들이 이번 우리 선거에서도 캐스팅 보드를 쥐었다고 한다. 이들이 선거 때가 되면 단순히 투표권을 행사하고 마는 정치 제도에의 수동적 참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적 주체로서 그리고 서로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면서 자생적으로 서로 돕는 행동의 주체로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와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강상중 교수가 지적한 “행복”의 생각을 바꾸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현재처럼 가족, 혈연, 지연 또는 힘이 있는 사람과의 연줄을 찾는 방식의 개인주의적 연대가 아니라 이웃을 수평적으로 돕는 새로운 연대를(예를 들어, 새로운 조합운동을 들 수 있다. 이를 이론적 담론으로 ‘사회적 경제’담론이라고 한다) 찾아야 할 것이다. 비록 작은 규모로라도, 또는 어설픈 실험이더라도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거나 또는 실험하려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그런 실험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멕시코, 방송통신시장 개혁 움직임 | 2013-03-27 |
|---|---|---|
| 다음글 | 쿠바와 미국의 관계 변화 징후 | 2013-03-29 |




 중남미
중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