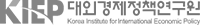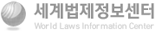전문가오피니언
오타카르 2세 (Otakar II)
체코 김장수 관동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2014/09/17
13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체코 왕국의 부상은 왕권확립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영농 기술의 도입과 황무지 개척, 활발한 광산 개발과 수공업의 활성화, 도시의 발달 등 경제적 성과역시 왕권확립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중부 유럽에서 ‘다크 호스(černý kůň)’로 등장한 체코 왕국은 기존 영역에 만족하지 않고 영토 확장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리고 1228년 체코 왕국의 위정자로 등장한 바츨라프 Ⅰ세(Václav I: 1228-1253)가 이러한 정책을 본격화시켰는데 그것은 이 인물이 오스트리아-슈타이어마르크(Österreich-Steiermark) 가문과의 결혼정책을 통해 체코 왕국의 영역을 확대시키려고 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인물에 이어 체코 국왕으로 등극한 프르제미슬 오타카르 2세(Přemysl Otakar II: 1248/53-1278)는 바츨라프 1세가 추진했던 정책을 더욱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1230년 바츨라프 1세의 차남으로 태어난 오타카르 2세는 왕위계승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궁내관이었던 케르텐의 필립(Philipp von Kärnten)으로부터 역사, 라틴어, 그리고 독일어 등을 배웠는데 이러한 것들은 당시 위정자들에게나 필요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1246년에 발생한 돌발 상황, 즉 왕위계승자였던 블라드슬라프(Vladislav)가 사망함에 따라 왕위계승권은 차남인 오토카르에게 이양되었고 이것은 바츨라프 1세가 1247년 3월 27일 오타카르를 모라비아 변경백으로 임명한데서 공식화되었다. 지금까지 체코 왕국의 왕위계승자, 즉 장자들은 장자상속권(Primogenitur)에 따라 모라비아 변경백으로 임명되었다가 선왕이 사망한 후 왕위에 올랐다.
1246년 오스트리아-슈타이어마르크의 위정자였던 프리드리히(Friedrich)대공과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Friedrich II)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바츨라프 1세는 예상과는 달리 프리드리히 2세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48년 오스트리아에서 내분이 발생한 후 일련의 오스트리아 귀족들과 성직자들이 바츨라프 1세에게 개입을 요청함에 따라 체코 군주는 원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친슈타우퍼(Staufer) 성향의 귀족들이 주도한 연합군은 바츨라프 1세의 원정군을 격파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코 영토의 상당수도 점령하는 의외의 전과를 거두었는데 이것은 오타카르의 은밀한 지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뒤늦게 연합군과 오타카르사이의 협력을 인지한 바츨라프 1세는 오타카르를 자신의 후계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후회했고 이후부터 바츨라프 1세와 오타카르 사이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슈타우퍼 성향의 귀족들은 1248년 7월 31일 프라하(Praha)에서 오타카르를 ‘젊은 국왕’으로 선출했고 이것은 2명의 군주가 동시에 체코 왕국을 다스리는 비정상적인 상황도 초래시켰다. 이후 부자 사이의 대립은 무력적 충돌을 유발시키는 극단적 상황까지 진행되었는데 결국 바츨라프 1세의 양보로 그러한 대립은 1249년 3월에 종료되었다. 이때부터 바츨라프 1세는 자신의 아들 오타카르를 공동통치자로 인정했고 오타카르 역시 아버지와의 화해성 접근에 대해 적극성을 보였다. 오토카르는 오스트리아의 대부분을 점령한 후 빈(Wien)을 제국직속도시, 즉 황제직할도시로 선포했다.
그리고 1250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와 오스트리아-슈타이어마르크의 프리드리히 대공이 사망함에 따라 바츨라프 1세는 오스트리아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확보하게 되었다.
1253년부터 오타카르는 체코 왕국을 단독으로 통치하게 되었고 그 자신을 프르제미슬 오타카르 2세라 칭했다. 이 인물은 1248년 11월부터 자신의 부친인 바츨라프 1세와 공동으로 체코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오타카르 2세는 1260년 크레쎈브룬(Kressenbrunn) 전투에서 헝가리 군을 격파한 후 다음해 체결된 빈(Wien)평화조약에 따라 헝가리 국왕인 벨라 4세(Béla IV:1230-1270)로부터 슈타이어마르크(Steiermark)를 양도받았다. 벨라 4세는 1250년 오스트리아-슈타이어마르크 대공 프리드리히 2세(Friedrich II)가 라이타(Leitha)전투에서 사망한 이후 이 인물의 통치영역을 차지하려고 했으나 그의 구상은 일단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그는 교황 인노첸시오 4세의 중재로 1254년 오펜(Ofen)에서 체결된 평화조약에서 슈타이어마르크의 점유를 인정받았다.
슈타이어마르크를 차지한 이후 오타카르 2세는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노 4세(Urben IV:1261-1264)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인 마르가르테(Margarete)와 이혼했다. 그리고 이 인물은 마인츠(Mainz)에서 헝가리 국왕의 손녀딸인 쿠니군데(Kunigunde von Halitsch)와 결혼했는데 이것은 헝가리와의 친선 및 동맹관계를 고려한데서 비롯된 것 같다. 1251년 오스트리아 귀족들로부터 대공(dux Austriae)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1252년 2월 11일 하인부르크(Hainburg)의 예배당에서 마르가르테와 결혼했는데 이 당시 그녀의 나이는 52세였다.
이렇게 오타카르 2세의 위상이 증대됨에 따라 당시 신성로마제국의 공동 황제였던 콘월(Cornwall) 백작 리처드(Richard: 1257- 1272) 영국 존(John)왕의 둘째아들이었던 리처드는 1227년 콘월 백작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 인물은 1257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선출되었다.
와 카스티야(Castile) 알폰스 10세(Alfons X: 1257-1273) 이 인물은 루돌프에 의해 황제자리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는 각기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오타카르 2세와 긴밀한 접촉을 모색했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267년 오타카르 2세는 후계자가 없던 케르텐(Kärnten) 대공 울리히 3세(Ulrich III)와 상속조약을 체결했고 그것에 따라 그는 1269년 울리히 3세가 사망한 후 케르텐과 크라인(Krain)을 체코왕국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케르텐과 크라인의 귀족들은 오타카르 2세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오타카르 2세와의 무력적인 대립도 피하지 않았다. 아울러 신성로마제국의 제후들 역시 오타카르의 영토 확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향후 그가 신성로마제국에서 지향하던 목적, 즉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등극하는 것을 무산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위 초부터 오타카르 2세는 선교적 목적을 가진 북방 정벌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그러다가 그는 1254년 교황 인노첸시오 4세(Innocent IV:1243-1254)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발트 해 연안의 프루첸(Pruzzen) 발트 해 연안에 살았던 프루첸 인들은 15-16세기에 멸종되었다.
과 리투아니아에 대한 원정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독일 기사단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황청의 호의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가졌다 하겠다. 1249년 4월 교황 이노센트 4세(Innoent IV:1243-1254)는 친슈타우퍼성향의 폭동을 주도한 혐의로 오타카르를 파문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야만 상태 하에 있었던 리투아니아와 그 주변 지역을 정복한 후 바로 기독교로 개종시켜 격상이 예상되던 모라비아의 올로모우츠(Olomouc) 대주교청에 복속시킨다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오타카르 2세가 북방 정벌에 나섰지만 리투아니아 정벌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그것에 따라 자신의 구상 역시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즉 쾨니히스베르크(Königsberg)라는 도시 이름 속에서 오타카르 2세의 정벌 흔적이 나타나는데, 이 도시의 이름은 왕에 대한 경의의 증표로 붙여진 이름이었다. 오타카르 2세는 1270년 벨라 4세의 죽음으로 초래된 헝가리 왕국 내의 혼란기를 이용하여 1271년과 1273년 두 차례에 걸쳐 헝가리 정벌에 나서 서부 슬로바키아와 파노니아(Pannonia) 일부를 정복했지만 이들 지방을 계속해서 자신의 지배하에 두지는 못했다. 이 당시 로마교황 그레고리오 10세(Gregory X:1271-1276)는 벨라 4세에 이어 등극한 라슬로(Laszlo)의 정통성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오타카르 2세의 즉각적인 헝가리 철수도 강력히 요구했다.
중부 유럽과 신성로마제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로 부상한 오타카르 2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은 콘라드 4세(Konrad IV:1237-1254)가 서거한 직후, 즉 1255년부터 있었고, 오타카르 2세 역시 그러한 것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1255년과 달리 1273년 초부터 오타카르 2세는 자신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되어야 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실천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보였다.
실제적으로 이 당시 오타카르 2세는 자신이 추대하지 않는 인물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등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 내에서 자신의 제 권리를 방해 없이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국 내 제후들은 오토카르 2세의 막강한 위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 당시 제국 내 제후들은 지나치게 강력한 황제가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교황청 역시 비슷한 이유로 오타카르 2세의 황제 즉위를 지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1273년 10월 1일에 시행된 신성로마제국 황제선출에서 황제를 선출할 권리를 지닌 선제후들은 무명의 합스부르크(Habsburg)가문출신의 루돌프(Rudolf:1273-1291)를 황제로 추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선제후들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체코 국왕대신에 같은 독일인이었던 루돌프를 선출했다고 해서 이것이 독일 민족주의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당시 근대적 개념의 민족주의나 민족의식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과 오토카르 2세의 궁에도 많은 독일인들이 활동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타카르 2세의 치세 동안 절정을 이룬 독일인들의 대규모 이민으로 체코는 체코 단일 민족에서 독일 민족과 공존하는 다민족국가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물론, 전체적으로 체코 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특히 독일과의 국경 지대에는 다수의 독일인들이 거주하는 독일인 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루돌프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선출됨에 따라 오타카르 2세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했고 거기서 그는 루돌프의 선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이 당시 오타카르 2세는 루돌프를 자신의 경쟁자가 아닌 ‘변변치 않은 백작(comes humilis)’으로 간주했다. 오타카르 2세의 입장이 밝혀짐에 따라 루돌프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영토반환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응수했는데 이것은 오토카르 2세가 차지하고 있던 알프스의 에거란트(Egerland)를 겨냥한 것이었다.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1275년 아우구스부르크(Augsburg)에서 제국재판협의회가 개최되었고 거기서 오타카르 2세는 패소했다. 이후 자신감을 가지게 된 루돌프는 오타카르 2세에 대한 국외추방이라는 강수를 두었고 그것은 오타카르 2세의 입지를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도 되었다. 실제적으로 오타카르 2세는 신성로마제국과 인접 국가들, 특히 폴란드에서 자신을 지지하던 마지막 세력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나아가 체코 왕국 내에서 귀족들의 확실한 지원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왕국의 남부 지방에서는 오타카르 2세의 강력한 경쟁가문이었던 비츠코베츠(Vítkovic)가문의 자비시(Záviš)가 주도하는 폭동도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 즉위한 루돌프는 즉시 오타카르 2세에게 에거란트 반환을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 오타카르 2세가 거부함에 따라 양국사이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276년 오타카르 2세는 당시 루돌프의 연합 군대가 포위한 빈을 구출하기 위해 출정했지만 체코 귀족들의 비협조로 전쟁의 양상은 루돌프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토지 사유법의 혜택으로 경제적 부를 구축한 후 자신들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 체코 귀족들은, 신성로마제국 내 대다수 제후들이 강력한 황제의 등장을 견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익과 자율성을 위협하는 강력한 군주의 등장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12세기부터 부상하기 시작한 대귀족들의 권위와 힘은 막강했기 때문에 이들은 점차 체코 정치에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의 대표적 대귀족들로는 보헤미아 지역의 로줌베르크(Rožmberk), 인드르지후프 흐라데츠(Jindřichuv Hradec), 리즘부르크(Rýzmburk), 리흐템부르크(Lichtemburk), 리파(Lipá), 스트라코니체(Strakonice), 슈텐베르크(Štenberk), 모라비아 지역의 페른슈테인,(Pernštejn) 보스코비츠(Boskovic), 침부르크(Cimburk) 등이 있었으며, 남부 보헤미아와 바이에른에 영지와 봉토를 소유하고 귀족 중의 귀족으로 간주되던 비츠코베츠(Vítkovic)가는 자비시(Záviš z Falkenštejna)라는 당대의 걸출한 정치인을 탄생시키면서 13세기 후반부터 체코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이들 귀족들이 거의 모두가 독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은 이들이 독일 귀족들을 외양적으로 모방한 것이지, 내면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체코 민족의식과 긍지로 충만한 당당한 체코 귀족들이었다.
결국, 오타카르 2세는 1276년 빈에서 체결된 강화 조약에서 알프스의 모든 지역과 오스트리아 점령지를 루돌프에게 양보해야만 했다. 이제 오타카르 2세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지방만을 통치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반루돌프 전선을 구축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실제적으로 빈 강화 조약이후 오타카르 2세는 재기의 기회를 모색했고 그것을 위한 마지막 결전도 준비하고 있었다. 비록 외부로부터 원군을 얻으려던 오토카르 2세의 노력이 실패로 끝났지만 루돌프의 사주 및 공작으로 분열 상태 하에 놓여있었던 체코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 오토카르 2세는 1278년 8월 26일 모라프스케폴레(Moravské pole)에서 신성로마제국과 헝가리의 연합군과 격전을 펼쳤다. 이 전투에서 패한 45세의 오타카르 2세는 후퇴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에게 개인적 원한을 가졌던 몇 몇 비기사적인 케르텐 기사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렇게 오타카르 2세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원대한 야망은 무산되었고 그의 광대한 제국 역시 붕괴되었다. 이후 그의 시신은 30주 동안 빈 프란체스코교단 교회에 안치되었다가 다음해인 1279년 즈노이모(Znojmo) 프란체스코 교회가 운영하던 납골당(Krypta)에 매장되었다. 이로부터 18년이 지난 후, 즉 1297년 그의 유골은 프라하로 옮겨져 성 비트(Katedrála sv.Vita) 대성당에 안치되었다. 모라프스케폴레에서 생을 마감한 오타카르 2세의 기개와 위용은 경제적 부와 군사적 힘을 구가한 ‘황금과 철의 왕’으로서, 또 불세출의 영웅으로서 후세 시인들의 칭송 대상이 되었는데, 특히 단테의 ‘신곡(Divina Comedia)’ 연옥편의 제 7장(canto)에서 당대의 가장 뛰어난 영웅 중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 국가의 세력 확산으로 국제적 질서체제가 위협을 받을 경우 그것에 대응하는 세력이 구축되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오타카르 2세의 막강한 위상에 대해 심대한 위협을 느끼던 신성로마제국 내 제후들의 대응책, 즉 합스부르크의 루돌프 대공을 신성로마제국 황제로 선출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푸틴(Putin) 대통령의 대우크라이나(Ukraine) 정책과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지금까지 체코 왕국의 왕위계승자, 즉 장자들은 장자상속권(Primogenitur)에 따라 모라비아 변경백으로 임명되었다가 선왕이 사망한 후 왕위에 올랐다.
2) 오토카르는 오스트리아의 대부분을 점령한 후 빈(Wien)을 제국직속도시, 즉 황제직할도시로 선포했다.
3) 이 인물은 1248년 11월부터 자신의 부친인 바츨라프 1세와 공동으로 체코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4) 벨라 4세는 1250년 오스트리아-슈타이어마르크 대공 프리드리히 2세(Friedrich II)가 라이타(Leitha)전투에서 사망한 이후 이 인물의 통치영역을 차지하려고 했으나 그의 구상은 일단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그는 교황 인노첸시오 4세의 중재로 1254년 오펜(Ofen)에서 체결된 평화조약에서 슈타이어마르크의 점유를 인정받았다.
5) 1251년 오스트리아 귀족들로부터 대공(dux Austriae)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1252년 2월 11일 하인부르크(Hainburg)의 예배당에서 마르가르테와 결혼했는데 이 당시 그녀의 나이는 52세였다.
6) 영국 존(John)왕의 둘째아들이었던 리처드는 1227년 콘월 백작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 인물은 1257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선출되었다.
7) 이 인물은 루돌프에 의해 황제자리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8) 발트 해 연안에 살았던 프루첸 인들은 15-16세기에 멸종되었다.
9) 1249년 4월 교황 이노센트 4세(Innoent IV:1243-1254)는 친슈타우퍼성향의 폭동을 주도한 혐의로 오타카르를 파문했다.
10) 이 당시 로마교황 그레고리오 10세(Gregory X:1271-1276)는 벨라 4세에 이어 등극한 라슬로(Laszlo)의 정통성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오타카르 2세의 즉각적인 헝가리 철수도 강력히 요구했다.
11) 1255년과 달리 1273년 초부터 오타카르 2세는 자신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되어야 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실천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보였다.
12) 특히, 12세기부터 부상하기 시작한 대귀족들의 권위와 힘은 막강했기 때문에 이들은 점차 체코 정치에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의 대표적 대귀족들로는 보헤미아 지역의 로줌베르크(Rožmberk), 인드르지후프 흐라데츠(Jindřichuv Hradec), 리즘부르크(Rýzmburk), 리흐템부르크(Lichtemburk), 리파(Lipá), 스트라코니체(Strakonice), 슈텐베르크(Štenberk), 모라비아 지역의 페른슈테인,(Pernštejn) 보스코비츠(Boskovic), 침부르크(Cimburk) 등이 있었으며, 남부 보헤미아와 바이에른에 영지와 봉토를 소유하고 귀족 중의 귀족으로 간주되던 비츠코베츠(Vítkovic)가는 자비시(Záviš z Falkenštejna)라는 당대의 걸출한 정치인을 탄생시키면서 13세기 후반부터 체코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이들 귀족들이 거의 모두가 독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은 이들이 독일 귀족들을 외양적으로 모방한 것이지, 내면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체코 민족의식과 긍지로 충만한 당당한 체코 귀족들이었다.
13) 모라프스케폴레에서 생을 마감한 오타카르 2세의 기개와 위용은 경제적 부와 군사적 힘을 구가한 ‘황금과 철의 왕’으로서, 또 불세출의 영웅으로서 후세 시인들의 칭송 대상이 되었는데, 특히 단테의 ‘신곡(Divina Comedia)’ 연옥편의 제 7장(canto)에서 당대의 가장 뛰어난 영웅 중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크로아티아 정부의 다양한 행보 | 2014-09-24 |
|---|---|---|
| 다음글 | 동유럽 진출을 향한 러시아의 판도라 상자, 우크라이나의 생존 전략과 향방 | 2014-09-30 |




 중동부유럽
중동부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