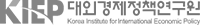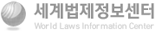연구정보
[종교] 스리랑카 승가에서 아란냐까 전통의 정통성과 연속성
스리랑카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김한상 불교학보 발간일 : 2017-03-31 등록일 : 2018-02-03 원문링크
본 논문의 목적은 스리랑카 승가의 아란냐까 전통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그 정통성과연속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아란냐까(araññaka) 또는 빰수꿀리까(paṃsukūlika)는 마을과도시에 사는 가마와신(gāmavāsin)과 대비되는 승려 그룹이다. 비록 아란냐까들은 수적으로 비주류였지만 그들의 소박한 거처로, 버려진 누더기로 만든 분소의를 걸친 빰수꿀리까와 함께 오늘날까지 이상적인 승려로 간주되어왔다. 서기 5세기에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Mahāvihāra)에서 머물며 테라와다 불교를 성문화한 붓다고사(Buddhaghosa)는 자신의주석서들이 ‘장로들의 계보의 등불(theravaṃsappa-dīpa)’인 마하위하라 장로들의 교학을거스르지 않는다고 말한다. 붓다고사 자신도 그러한 존칭으로 묘사되고 있다. 연대기들에서도 아란냐꺄들에게 ‘장로들의 계보의 등불’과 ‘장로들의 계보의 빛(theravaṃsekapajjota)’ 이라는 존칭들이 부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존칭들은 마힌다 테라(Mahinda Thera)에게 돌아간 랑까의 등불(laṅkā-dīpa)이라는 존칭과 중첩되고 있다. 연대기는 승가가 빠라끄라마바후 1세 왕(King Parākramabāhu I)의 불교 정화(sāsanasodhana) 를 통해서 붓다 당시의 승가로 복원되었다고 말한다. 담바데니아(Dam̆ badeṇiya) 시대의 아란냐까 수장에게는 ‘땀바빤니의 기치(Tambapaṇṇi-dhaja)’라는 존칭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필자는 아란냐까 전통의 정통성과 연속성이 등불(dīpa)과 빛(pajjota)과 기치(dhaja)라는 은유법으로 표현되었으며, 아랸냐까 전통이 마힌다 테라뿐만 아니라 붓다에게까지도 소급되는 참된 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란냐까들이 숲속 수행에서 얻은 지혜와 세련된 도덕적 감각은 스리랑카 승가가 위기에 처했을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쇄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주기적으로 고대 숲속 수행의 이상을 재확립하고자 하는 시도는 스리랑카 승가의 역사의 세부적 특징들 가운데 하나이며, 스리랑카 승가의 역동성은 가마와신과 아란냐까 사이의 상호작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스리랑카 불교가 기로에 서게 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가마와신과아란냐까 사이의 건전한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에서 간타두라(gantha-dhura) 또는 교학(pariyatti)과 위빳사나두라(vipassanā-dhura) 또는 수행(paṭipatti)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전문적 전통을 다시 일원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생각된다. 이는 곧 초기 불교의 이상적 승려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종교] 스리랑카 빨리⋅불교학 - 역사적 고찰과 분석 - | 2018-02-03 |
|---|---|---|
| 다음글 | [지역] 수혜자 인식조사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 - 스리랑카 직업훈련원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 | 2018-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