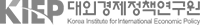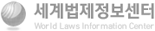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최초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
우즈베키스탄 EMERiCs 2025/01/24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러시아ㆍ유라시아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즈베키스탄, 폐기물 에너지 산업 진출
o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폐기물 관리 정책 강화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폐기물 관리 및 재생에너지 정책 강화를 2025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와 첨단 기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13억 달러(약 1조 8,600억 원) 규모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알려졌다.
-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약 1,40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나 재활용률이 4-5%에 불과하며, 매립지에서 연간 700만 톤의 온실가스와 4만 3,000톤의 유해 침출수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다.
o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기술 확보
- 우즈베키스탄은 폐기물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기업인 상하이SUS환경(Shanghai SUS Environment Co. Ltd)은 우즈베키스탄의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례로 2024년 5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양해각서를 체결 이후, 인력 양성, 현지 대학 및 전문기관과의 공동 연구,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 양국은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폐기물 관리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중국의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의 에너지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설비 생산을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국내 제조업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2027년까지 8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건설 계획 발표
o 우즈베키스탄,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
- 우즈베키스탄은 8개의 에너지 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해외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CAMC엔지니어링(CAMC Engineering)은 3억 5,000만 달러(약 5,000억 원)를 투자해 안디잔(Andijan)과 타슈켄트(Tashkent) 지역에 2개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며, 일일 4,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연간 6억 3,0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하이SUS환경은 사마르칸트(Samarkand)와 카슈카다랴(Kashkadarya) 지역에 3억 1,000만 달러(약 4,440억 원)를 투자해 2개 발전소를 건설하여 일일 3,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연간 4억 8,0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UAE 타드위어(Tadweer) 그룹은 부하라(Bukhara)와 나보이(Navoi) 지역에 2억 달러(약 2,860억 원) 투자해 일일 1,5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연간 3억 6,3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며, 한국의 세진(Sejin)은 5,500만 달러(약 787억 원)를 투자해 오한가론 매립지에 있는 매립가스를 추출하여 16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상기 시설이 모두 가동되면 연간 150만 입방미터 이상의 천연가스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o 주변국과의 폐에너지 경쟁 가속
-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적극적인 폐에너지 투자는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강화했다. 일례로, 키르기스스탄은 2025년 말까지 비슈케크 매립장 부지에 일일 기준 1,000톤 처리 용량(일일 460MWh 전력 생산)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키르기스스탄의 총 투자규모는 9,500만 달러(약 1,360억 원)로, 향후 일일 처리 용량을 3,00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 수치가 우즈베키스탄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규모에 비해 작은 규모이지만, 사업 완료 시점이 2025년 말로 예정되어 있어 중앙아시아 최초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우즈베키스탄, 강도 높은 환경규제 도입
o 도시지역 내 신규 산업시설 운영 전면 금지 결정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2030(Uzbekistan-2030)' 전략과 '환경보호 및 녹색경제의 해(Year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reen" Economy)'를 위한 대통령령 초안을 발표하고, 타슈켄트, 누쿠스(Nukus) 및 지역 중심도시 내 신규 산업시설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2023년 기준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 180만 톤 중 차량 배출이 100만 톤(57%), 산업 및 제조시설이 80만 톤(43%)을 차지하고 있으며, 7,036개 생산시설에서 연간 1억 2,560만 톤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는 등 도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대통령령 배경을 설명했다.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석탄 및 중유 사용량 증가 추세에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석탄 사용량이 2019년 390만 톤에서 2023년 1,100만 톤으로 급증하고, 중유 사용량도 최근 2년간 5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천식, 알레르기, 만성 기관지염 등 각종 만성질환 발병률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o 단계적 시행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구조 재편 추진
- 상기 신규 규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석면·시멘트 생산시설 ▲가죽·제혁 공장 및 가금류 사육시설 ▲고효율 분진·가스 처리 시스템이 없는 석탄 연소시설 ▲철·비철금속 제련소 ▲유해 불순물이 포함된 유리 및 유해화학물질 생산시설 ▲1급, 2급 위험물로 분류되는 폐기물 처리·소각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시설의 신규 프로젝트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없으며, 사실상 신설이 제한된다.
-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5년 10월 1일까지 내각에 기존 산업시설 168개소의 단계적 이전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는 독일 루르(Ruhr) 지역의 산업시설 이전 사례를 주요 모델로 삼은 것으로, 독일은 인구밀집 지역 내 석탄 기반 산업시설을 산업단지로 이전하여 대기오염을 60%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arec, Uzbekistan to become first country in Central Asia where household waste will be converted into energy, 2025.01.09.
Daryo, Uzbekistan to become first country in Central Asia to convert waste into energy, 2025.01.03.
Energy News, Uzbekistan invests $1.3 billion in waste-to-energy projects, 2024.10.22.
Global Flow Control, Uzbekistan to Build 8 Waste-to-Energy Plants by 2027, 2025.01.03.
ICSD, Eight waste-to-energy plants to be built in Uzbekistan, 2024.10.23.
Reuters, Uzbekistan announces $1.3 bln in waste-to-energy projects, 2024.10.21.
Akchabar, Energy from waste: Who will be the first in Central Asia, 2025.01.17.
The Times of Central Asia, Uzbekistan Launches Two New Environmental Projects, 2025.01.22.
Ministry of Ecology of Uzbekistan, It is proposed to relocate the activities of new industrial enterprises outside the city, 2025.01.20.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러시아, 이란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 | 2025-01-24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러시아, IT 시장 불확실성 고조... 산업 위기 심화 | 2025-01-31 |




 러시아ㆍ유라시아
러시아ㆍ유라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