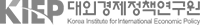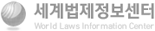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중앙아시아, 미-중 지정학적 경쟁 속 지역 안보 과제 직면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5/30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러시아ㆍ유라시아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앙아시아 정책 변화와 지역 외교에 대한 함의
o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변화
- 2025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외교정책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이와 관련,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부장관은 2025년 1월 인준청문회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잭슨-배닉 수정조항(Jackson-Vanik amendment)*’ 철회를 지지하며,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표명함.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과 무역하는 대부분의 국가에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카자흐스탄에는 27%의 고율 관세를 적용함. 이후, 90일 유예 기간 동안 관세율이 10%로 조정되었으나, 이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무역 정책이 주로 경제적 목적에 기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
*1974년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일환으로 도입된 냉전 시대의 인권 중심 무역 제재 조항으로, 시행 초기 소련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냉전 종식 이후에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권 국가에 형식적으로 적용
o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지정학적 함의
-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이 ▲거래적(transactional), ▲경쟁적(competitive), ▲제한적(limited) 성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관찰된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마키아벨리 사상’과 ‘거래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관계를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이 잠재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무역, 인프라, 투자를 통한 중국의 중앙아시아 내 경제적 존재감 확대는 개발 지원이 아닌 전략적 침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를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속, 미국은 중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보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찰됨.
□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 및 안보 영향력 확대
o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적 진출 확대
- 중국은 일대일로(BRI)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특히, 2020년 이후 중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여 2020-2023년 기간 총 136%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카자흐스탄은 역내 중국 상품의 최대 수입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여타 국가들 역시 동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중앙아시아 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및 무역 관계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핵심 원자재(CRMs: Critical Raw Materials)에 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중앙아시아는 상당한 규모의 핵심 원자재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희토류 원소, 리튬, 코발트 등의 광물은 첨단 산업과 친환경 기술에 필수적인 원자재로 평가됨. 중국 기업들은 채굴 및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전역에 630억 달러(약 87조 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하였으며, 2024년에는 카자흐스탄과 첨단 구리 제련 시설 건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o 중국, 안보 영역으로 협력 확대
-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최근 안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무기 판매 증가시키고 있으며, 디지털 감시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드론, 방공 시스템, 무인항공기(UAV)를 구매하기 시작하였으며, JF-17 전투기 구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주도권 확보 노력 및 카자흐스탄의 리더십
o 중앙아시아 국가들, 지역 통합 및 안보 협력 증진 노력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다수 국가들과의 외교적 균형을 추구하는 ‘다원적 외교 정책(multi-vector diplomacy)’을 구사해왔으나, 최근 역내 미-중 영향력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균형적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관계에서 ‘중립적(neutral)’ 외교보다는 확실한 파트너십을 선호하고 있는 바,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보다 명확한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균형적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주도권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표적으로, 지난 2025년 3월에는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간 국경 획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주요 사례로 평가됨.
-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가 미-중 영향력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 간 무역을 확대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리는 등의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함. 특히,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는 국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외부 경제 환경에 대한 취약성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각국은 보다 적극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하여 다양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 중앙아시아를 강대국 경쟁을 위한 지역이 아닌 글로벌 협력의 플랫폼으로 부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o 카자흐스탄, 이주민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안보 개선 추진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서, 지역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상황 속, 카자흐스탄 정부는 미-중 경쟁 구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카자흐스탄은 지역 안보에 대한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로 평가되는 이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주민의 원활한 통합을 보장하고 중앙아시아 내 국경 교류를 촉진하는 ‘탈안보화(desecuritiz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정책은 투자자 및 고숙련 전문가를 위한 장기 비자 도입,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확대 등의 조치를 포함함. 실제, 카자흐스탄은 지난 2023년 약 2만 5,000명의 입국자와 1만 6,000명의 출국자를 기록하며 약 10년 만에 최초로 긍정적인 이주 균형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Kazakhstan’s Role in Shaping Regional Security in Central Asia, 2025.05.27.
The Diplomat, Central Asia’s Strategic Insecurity in a Turbulent World, 2025.05.16.
Special Eurasia,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U.S. – China Competition in Central Asia, 2025.02.13.123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수자원 안보 위기 심화 속 국제협력 및 기후적응 전략 추진 | 2025-05-30 |
|---|---|---|
| 다음글 | [월간정세변화] 아르메니아, 親유럽연합(EU) 노선으로 국가전략 전환 | 2025-05-31 |




 러시아ㆍ유라시아
러시아ㆍ유라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