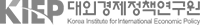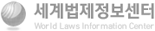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몽골,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강화 기조...‘제3의 이웃’ 정책 확대
몽골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7/04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러시아ㆍ유라시아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몽골-중앙아시아 외교 동향
o 2023년 이후 몽골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정상급 외교 활동 급증
- 몽골은 2023년 7월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방문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고위급 외교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음. 이후 2024년 10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 2025년 6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및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연이어 몽골을 방문하였으며, 각국은 양자 관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
- 후렐수흐 우크나긴(Khurelsukh Ukhnaa) 몽골 대통령 역시 2024년 6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Tashkent)를 방문하였으며, 7월에는 아스타나(Astana)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함.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위급 방문이 몽골의 외교정책에서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평가함.
o 양자 협정 체결 및 외교 공관 설치를 통한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
- 후렐수흐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방문 기간 14건의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타슈켄트 내 몽골 대사관 개설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양국 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며, 양국은 지난 협력을 통해 향후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아울러, 카자흐스탄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공식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SP: Strategic Partnership) 수립에 합의함.
-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2023년 자파로프 대통령의 몽골 방문 이후 울란바토르(Ulaanbaatar) 내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개관과 함께 양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주키르기스스탄 몽골 대사관은 주우즈베키스탄 몽골 대사관과 더불어 몽골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정치적 신뢰 구축과 실질적 협력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경제협력 다변화를 통한 對중국 의존도 완화 및 신규 교역로 개발
o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 확대 및 품목 다변화
- 몽골과 카자흐스탄 간 교역은 2021년 3,390만 달러(약 460억 원)에서 2024년 1월-8월 기간 중 8,390만 달러(약 1,100억 원)로 대폭 증가함. 카자흐스탄의 對몽골 주요 수출품목은 전화기(47.1%), 담배(21.1%), 초콜릿 및 코코아 함유 식품(3.8%) 등이 있으며, 몽골의 對카자흐스탄 수출은 주로 마육(馬肉)에 집중되어 2017년 290만 달러(약 40억 원) → 2022년 830만 달러(약 110억 원)로 증가함.
- 몽골-키르기스스탄 교역은 2017년 약 200만 달러(약 27억 원)에서 2022년 500만 달러(약 68억 원)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중고차량 및 소비재 재수출 등에 기인함.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은 2017년 100만 달러(약 13억 원) 미만에서 2022년 약 1,000만 달러(약 140억 원)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몽골의 육류 수출과 우즈베키스탄의 비료 수출이 주요 교역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음.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및 타지키스탄과의 교역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o 몽골-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신규 물류 회랑 개발 논의
- 카자흐스탄 교통부는 2024년 10월 러시아 영토를 경유하여 몽골과 연결되는 신규 회랑 개설을 제안하였으나, 러시아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보고되지 않아 추가적인 외교적 조율이 필요한 상황임. 동 회랑은 내륙국인 몽골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키르기스스탄 및 중국을 경유하여 우즈베키스탄-몽골을 연결하는 신규 화물 수송 회랑은 성공적인 시범 운영(6.20)을 마쳤으며, 이는 몽골과 중앙아시아 간 물류 협력의 실질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일부 전문가들은 몽골이 중앙아시아와의 물류 협력을 기반으로 향후 ‘중부 회랑(Middle Corridor)’과 같은 아시아-유럽 운송로 개발에 대한 참여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함.
□ 몽골의 ‘제3의 이웃’ 정책 개요 및 지정학적 의의
o ‘제3의 이웃’ 정책 개요 및 최근 지역 정세 동향
- 몽골은 2011년 외교정책 개념을 개정하면서 '제3의 이웃(Third Neighbour)'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도입함. 이는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선 여타 선진국들(제3의 이웃)과의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 한국, 튀르키예 등이 포함됨.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몽골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로의 전략적 선회(Pivot to Central Asia)는 이러한 ‘제3의 이웃’ 정책의 확대 적용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 몽골의 ‘제3의 이웃’ 정책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서방 파트너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동 정책은 중앙아시아에서의 안정성과 주권 증진이라는 서방의 전략적 목표와도 부합함.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2023.5.21.~22.)과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前 영국 외교부장관(2024.4.25.~26.)이 몽골 방문 이후 중앙아시아를 순방한 점은 서방의 對중앙아시아 정책에서 몽골의 가교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평가됨.
-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C5+1' 형식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관여해온 상황에서, 향후 몽골을 동 체제에 통합하여 'C6+1'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이와 관련, 미국 외교정책위원회(NCAFP: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는 2025년 4월 보고서에서 “몽골의 통합은 글로벌 공급망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분야에서 역내 전략적·경제적 도전 과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 일본과 한국 역시 몽골을 중앙아시아로의 핵심 관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소프트 파워(Soft Power) 및 투자 등을 기반으로 지역 통합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asia Magazine, Mongolia Pivot to Central Asia?, 2025.07.02.
The Diplomat, Mongolia’s Strategic Turn Toward Central Asia, 2025.06.30.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s Substack, Mongolia’s Pivot to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Strategic Realignments and Regional Implications, 2025.06.12.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월간정세변화] 카자흐스탄의 경제 전략 및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 분석 | 2025-07-01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아제르바이잔,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지역 세력균형 변화 기조 | 2025-07-04 |




 러시아ㆍ유라시아
러시아ㆍ유라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