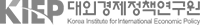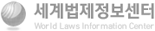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프랑스와 러시아의 영향력에 따른 서아프리카 지역 구도 변화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임기대 부산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장 2025/06/02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아프리카ㆍ중동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아프리카, 특히 사헬지역의 프랑스어권 국가들(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에서 최근 수년간 프랑스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202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군부 쿠데타와 이로 인한 정권 교체, 그리고 이들 쿠데타 집권 국가들이 지역 기구인 서아프리카경제연합(ECOWAS)을 탈퇴하면서였다. 흔히 ‘쿠데타(coup d’état) 벨트’1)라고 불리는 이 지역 국가들이 ECOWAS를 탈퇴한 이유는 이 기구가 친서구적인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컸기에 ‘쿠데타 벨트’ 국가들은 프랑스에 우호적인 ECOWAS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다. 또한 프랑스와 대립각에 있다 보니 프랑스와의 관계 ‘단절’이란 초강수를 두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군 철수 및 대사관 폐쇄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서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역학 관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대 이후 서아프리카 ‘쿠데타 벨트’ 지역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쿠데타 벨트’와 프랑스군 철수, ECOWAS 탈퇴 일지
서아프리카 내 범아프리카주의 확산
2023년 9월 16일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의 군사 지도자들이 상호 방위 협정인 사헬국가연합(Alliance des États du Sahel (AES), 영어: Alliance of Sahel States)을 설립하겠다며 립타코-구르마(Liptako-Gourma) 헌장을 발표한 이후 AES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 7월 6일 정치경제통합체로 출범을 합의했고, 2025년 들어서는 AES의 국기(2월 20일)와 국가(5월 10일)를 만들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범아프리카주의,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 주권 강화였다. 또한 이들 군부 지도자들이 내세운 이념은 아프리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 세대, 즉 MZ세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MZ세대들은 AES 3개국은 물론 서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주권 강화와 범아프리카주의, 반제국주의를 외치며 그와 결탁한 지도자들까지 비판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네갈을 시작으로 전개됐다. 세네갈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와 우호적 관계에 있던 국가이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프랑스에 대한 비판과 제국주의,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 시민사회 영역에서 늘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런 변화의 필요성 속에서 2024년 3월 44세의 새로운 젊은 지도자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Bassirou Diomaye Faye, 1980- )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파예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주권 국가 강화를 주장했고, 2025년 1월부터는 세네갈에서 프랑스군을 철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네갈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은 쿠데타만 없었지, AES 3개국에서 발생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 쿠데타 벨트 국가와 이질적이지만 범아프리카주의, 주권 회복 등을 내세운 건 AES 국가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AES 국가들을 비롯하여 서아프리카 국가들을 순방하여 지역 국가들 간의 연대와 화합, 범아프리카주의 정신을 구현해갈 것을 설득해갔다.2) AES 국가에게는 ECOWAS 잔류를 설득하기도 했다. 파예 대통령의 당선 이후 순방국을 통해 그의 행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표 2. 파예 대통령의 서아프리카 국가와 프랑스 방문 일지*
프랑스의 우방국 차드와의 균열
차드는 프랑스군이 말리에서 철수하며 가장 믿을만한 아프리카의 군사 동맹 국가였다. 프랑스는 식민 지배 당시 맺었던 ‘식민지 조약’에 근거하여 통화정책과 방위 협정을 맺으면서 차드의 주권을 제한해왔다. 그 결과 프랑스는 아무 문제 없이 차드에 군을 주둔시킬 수 있었다. 마하마트 이드리스 데비(Mahamat Idriss Déby, 1984- )는 독재자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권을 승계했다.3) 프랑스의 암묵적인 승인 하에 권력을 승계한 마하마트는 MZ세대들의 분노가 커가자 지역 안정을 명분으로 AES 국가들과 협력하였다. 2023년 10월 들어서는 프랑스군 철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마하마트는 2024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5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프랑스와 맺었던 방위 협정을 종료하고 주권을 되찾아오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와의 ‘식민지 협정’이 주권 국가로서 침해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에 대해 프랑스 언론이 비리를 폭로하자 젊은 마하마트는 더 이상 프랑스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 프랑스와 차드 간의 동맹 균열 상황을 가장 최근 발생한 사건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2024년 이후 프랑스와 차드 간 동맹 균열 상황***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차드 정부는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게 된다. UAE와 이스라엘에게서 무기 지원을 받았으며, 튀르키예로부터는 무인항공기를 지원받았다. 러시아 또한 호시탐탐 차드와의 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었다.
더 이상의 ‘프랑사프리크’는 없다
서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오랜 기간 군사·정치·경제적 후견인 역할을 해왔음은 주지한 바와 같다. 하지만 반프랑스 정서가 확산되자 사헬지역에서 프랑스군이 철수(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서 순차적으로 철수)하게 됐고, 프랑스 대사관 폐쇄 등으로 이어졌다. 프랑스군의 철수는 사헬지역 국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세네갈과 차드, 코트디부아르 등에서도 프랑스군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한때 만 명 정도 있었던 아프리카 내의 프랑스군은 이제 지부티와 가봉에만 남게 되었다. 그 수도 1500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군까지도 니제르에서 철수하며 사실상 서아프리카 일대가 서구와의 관계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이다. 미국은 니제르에서 드론 기지(‘Air Base 201’)를 운영해왔으나 현재는 쿠데타 발생 이후 철수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와 서구의 영향력 약화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프랑사프리크’4) 체제에 대한 반감이 지역 내 폭넓게 확산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프랑스와의 ‘특수관계’, 즉 ‘프랑사프리크’가 부패, 경제 침체, 정치적 후진성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서아프리카 MZ세대를 중심으로 강한 반감이 형성되었다.
- 프랑스의 군사 개입 실패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대테러 작전(Serval, Barkhane 등)에도 불구하고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지 못해 지역민의 불만이 커졌고, 이것은 당시 서아프리카에서 불기 시작한 MZ세대의 반프랑스, 반서구 정서와 맞물리면서 확산되었다.
-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MZ세대는 SNS 등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며, 반서구·반프랑스 정서와 범아프리카주의(자주성, 주권 강조)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독립 이후 주장해 온 범아프리카주의와는 다른 MZ세대 특유의 범아프리카주의 운동을 확산시킴으로써 주권 회복을 강조하는 젊은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었다.
- 그 결과 쿠데타를 통한 군부 혹은 젊은 지도자가 집권하면서 반프랑스, 반서구 노선을 공식화하고, 프랑스와의 군사·경제 협력을 축소하거나 단절했다. AES 국가와 기니를 중심으로 쿠데타 발생이 주를 이뤘지만,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은 세네갈과 차드에서도 범아프리카 정신과 주권 회복을 강조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니제르를 제외하고는 MZ세대가 최고 통수권자의 자리에 있는 것도 눈여겨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기니의 마마디 둠부야(1980년생), 말리의 고이타(1983년생), 부르키나파소 트라오레(1988년생), 세네갈의 파예(1980년생), 차드 마하마트 데비(1984년생) 등 30대부터 40대 초중반의 나이가 정권을 쥐고 있다. 이들은 쿠데타를 통해 혹은 변혁을 통해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하겠다며 대중들에 호소하여 권력을 쥐었다. 그들의 출현은 분명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의 정부가 출현하고 세대교체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프랑스의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러시아의 등장과 지역 구도 변화
이렇듯 지역 상황은 프랑스의 퇴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서아프리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군부 정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반프랑스, 반서구, 범아프리카주의 정신을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 확산을 주목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주요 흐름과 경로 몇 가지만을 주목하고자 한다.
- 러시아의 등장은 군사 협력 및 용병 파견에서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영향력이 있지만 소련이 붕괴한 후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2010년을 전후하여 무기 판매 등 군사 협력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다 프랑스 등 서구의 영향력 약화와 반제국주의 정서에 힘입어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시작했다.5) 서아프리카에서는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군부 정권이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Wagner)를 초청해 치안 유지, 대테러 작전, 정권 수호에 활용하면서 관계를 재개했다. 이후 러시아는 무기, 군사훈련, 정보 제공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반프랑스, 반서구의 지역민 정서를 활용하여 지역 구도 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다.
- 자원 개발 협력을 지원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니제르는 프랑스 및 서방 기업에 부여했던 우라늄 등 광물 채굴권을 박탈하고, 러시아(및 중국, 이란 등)와 새로운 개발 협력을 추진하며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다.6)
- 외교적·정치적 지원을 강화해가고 있다. 러시아는 군사정권과의 외교적 연대를 강화하며, 서구의 제재와 압박에 맞서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 러시아-아프리카정상회담은 물론 AES국가들과의 정상회담과 장관급 회담을 수시로 열어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5년 5월 10일 러시아-부르키나파소 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양국은 군사, 교육, 경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7)
- 범아프리카주의와 반서구 담론 확산이다. 러시아는 소셜미디어, 현지 인플루언서, 범아프리카주의 운동가(케미 세바8) 등)를 통해 반프랑스·반서구 정서를 조장하면서 아프리카의 새로운 우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변화를 통해 러시아는 서아프리카의 기니만에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까지 이어지는 과거 사하라 대상들의 경로를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는 방식으로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와 서구의 공백을 대신해가고 있다.
---
*각주
1) 쿠데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헬지역을 지칭하는 지정학적 신조어이다. 이 지역은 상술한 3개국 이외에도 수단 등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의 동서쪽으로 체인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임기대(2023), “사헬지역 테러집단과 ‘쿠데타 벨트’에 주는 함의”, 인문학연구 62/4. 191-211쪽.
2) France24, “Le président sénégalais effectue ses premières visites au Mali et au Burkina Faso”, 2024.05.30.
3) 마하마트 이드리스 데비의 아버지인 이드리스 데비 이트노(Idriss Déby Itno, 1952-2021)는 198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2021년 사망 전까지 차드의 대통령이었다. 반군과의 전투 중인 2021년 사망하며 아들이 권력을 승계하였다.
4) 프랑사프리크(Françafrique)는 '프랑스(France)'와 프랑스어로 아프리카를 뜻하는 '아프리크(Afrique)'의 합성어로, 프랑스와 아프리카 국가들(특히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국가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일컫는 용어를 일컫는다. 이 ‘특수한 관계’는 과거 프랑스가 정치, 경제, 군사 등에서 후견 역할 및 사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관계를 말한다 (임기대(2019),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전략: 정책 내용과 함의”, 아프리카 주요이슈 브리핑 2/2, 143-192쪽).
5) 성기은(2019), “러시아의 대아프리카 전략: 군사협력과 새로운 세력균형의 형성”, 아프리카 주요이슈 브리핑 2/2, 223-246쪽).
6) 2025년 4월 3일 모스크바에서 AES 국가 외무장관들과의 회담에서 러시아 정부가 광물자원 개발 및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고, 통합군대, 합동은행 창설 등을 러시아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우분투칼럼] 프랑스와 미국 빈자리 차지하는 러시아”, 2025.04.24.
7) 러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승 80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방문한 부르키나파소의 이브라힘 트라오레 대통령과 투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8) 베냉·출신의 극단 범아프리카주의자이다. AES국가는 물론 세네갈과 차드, 코트디부아르에서 과격적인 발언을 통해 인기를 얻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그가 네오나치와 결합하면서 인종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자 2024년 그의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기도 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월간정세변화]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외교와 경제 전략 변화 | 2025-05-30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UN 안보리 개혁 관련 아프리카 내 분열 양상...BRICS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채택 무산 | 2025-06-06 |




 아프리카ㆍ중동
아프리카ㆍ중동